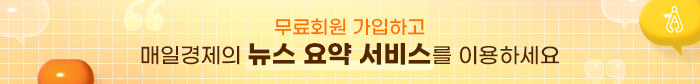맨땅만 덩그러니 `신한울 3·4호기` 경제적 피해는
지역사업 17개 줄줄이 취소
2500억 투자계획 수포로
울진지역 경제 피해액 67조
정부지원금도 年480억 급감
원자력공학과 전공변경 속출
국내 원전산업 뿌리째 `흔들`
지역사업 17개 줄줄이 취소
2500억 투자계획 수포로
울진지역 경제 피해액 67조
정부지원금도 年480억 급감
원자력공학과 전공변경 속출
국내 원전산업 뿌리째 `흔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지역 현안 사업만 17개다. 북면과 죽변의 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물론 원전 주변지 생태도시, 종합복지마을 조성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올해부터 원전이 건설될 5년간 총 사업비만 2500억원에 달한다. 지금도 세수가 줄고, 지역 소득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16년 말 5만1738명이던 이 지역 인구는 지난해 9월 말에는 5만83명으로 줄었다. 일감이 사라진 곳에 근로자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가 통째로 붕괴하고 있다. 신한울 1·2호기에 하루 평균 근로자 2210명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원전은 사실상 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실제 이 지역 인구 5만명 중 절반이 넘는 2만8000명이 원전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발생하는 매몰비용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막대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건설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역과 원전 업계 주장이다. 탈원전이 정부 정책 기조라고 하더라도 짓고 있던 신한울 3·4호기마저 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4~5년간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원전 업계의 '일감절벽'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본격적인 탈원전 시대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원전 산업 총 매출액은 27조4513억원에 달한다. 한 해 투자액만도 8조원이 넘고 직간접적으로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은 3만7232명이다.
실제로 짓던 원전마저 폐쇄하려는 정부의 과격한 탈원전에 국내 원전 산업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올해 KAIST에서 2학년 진학자 중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700여 명 중 단 4명에 그쳤다. 2016년만 해도 20명이 넘었던 지원자들은 2017년 9명, 지난해 5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서는 올해 정원 50명 중 1·2학년 17명이 전과를 신청했다. 현재 전국에 원자력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서울대, KAIST, 경희대, 한양대, 조선대 등 총 16개다. 2017년 기준 전국 원자력학과 재학생은 총 3095명이고 매년 졸업생 500여 명이 배출돼 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면서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고등학교로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마이스터고도 신입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할 처지다. 한 학년 정원이 80명인 이 학교는 2017년만 해도 경쟁률이 3대1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대1로 간신히 정원을 채운 실정이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탈원전 때문에 산업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노후 원전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한국도 10년만 지나면 영국처럼 원전 생태계가 파괴돼 원전 기술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시공·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그쳐 수출 호기를 맞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기회가 박탈돼 버렸다는 것이다.
원전 산업이 사라진 자리를 원전 해체 산업으로 메우자는 정부 발상도 허황된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용훈 교수는 "원전 1기를 60년간 운영할 때 원가는 30조원에 달하고 그중 절반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며 "반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60년간 2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